 |
| ▲ 윤희순 의병장 초상화.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적 순간에 존재감을 보였던 여성을 조명합니다. 시대의 억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놨거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은 많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물론 유관순 열사 같은 훌륭한 인물도 있었으나 그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75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을 받았으나 그녀들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다. 늦었더라도 매몰돼 있는 역사를 하나씩 꺼내 의미를 되살려야 하는 건 후대의 몫이고, 오늘은 그러한 노력에 미력하나마 무게를 얹을 기록을 이야기하려 한다.
윤희순은 1860년 경기도 양주군에서 유학자인 윤익상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16세에 춘천 의병장 유홍석의 장남이자 팔도창의대장 유인석의 조카인 유제원과 혼인했다. 이러한 시댁 분위기의 영향으로 윤희순은 의병운동에 뜻을 두게 됐다.
그녀가 처음으로 역사에 모습을 드러낸 건 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때였다.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를 비롯한 여러 노래를 만들어내 항일의식을 고취시켰고, 여성들도 구국 활동의 중심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07년 고종황제가 폐위되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면서 윤희순은 직접 군자금을 모아 탄약 제조소를 설립했다. 놋쇠와 구리를 구입해 탄환을 제작·공급했다. 여성 의병들을 모집해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비록 의병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후방에서 그들을 적극 지원하며 의병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녀가 남긴 8편의 의병가는 최초의 한글 의병가인 동시에 민족 저항 시가로 남아 있다.
 |
| ▲ 춘천시립도서관에 위치한 윤희순 의병장의 동상. |
경술국치 이후 1911년에는 시아버지·남편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순은 현지에서 논을 개발하고 벼농사를 지어 군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항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당을 만들어 다수의 항일운동가를 배출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녀는 만주로 옮겨가 중국인들과 힘을 합쳐 조선독립단을 만들었고, 이어서 조선독립단 가족부대와 조선독립단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조선독립단 학교는 여러 분교를 추가로 만들어 항일운동가 양성에 전력을 쏟았다.
그러던 중 대한독립단에 가입해 투쟁하던 맏아들 유돈상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문 끝에 1935년 7월 19일 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대에 걸쳐 의병활동의 뒷바라지를 하던 윤희순는 아들의 순국 10여 일 뒤인 8월 1일 향년 76세로 만주에서 일생을 마쳤다. 1990년에 이르러 그녀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고, 2008년 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하지만 만주 해성현에 묻힌 윤희순의 유해는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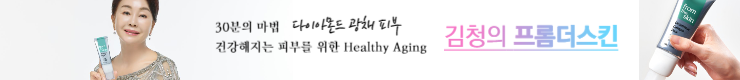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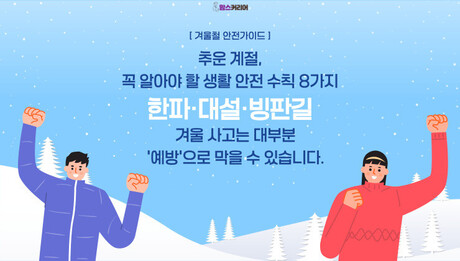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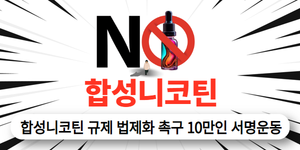
![[아이와 문화생활] 한글은 ‘한글용사 아이야’로 배워요!](/news/data/2025/09/23/p1065616863842460_7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