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물가 상승으로 소득 증가 체감 못해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 위협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됐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고용자도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미달하는지 잘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월급이 아닌 주급 또는 시급으로 임금을 받더라도 이를 일한 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임금 중 △현물로 지급받은 것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1% 이내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수습 기간인 경우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 및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받는다.
2021년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최근 2년 동안 연 5%씩 인상되면서 올해 9620원이 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 664명 중 76.2%가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대폭 늘어난 지출(77.7%)을 꼽았고 △기존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서(15%) △임금 인상 폭이 저조해서(8.1%)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해서(6.1%)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4.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가게의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껑충 뛰어올라 생계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자 아예 장사를 접는 사람들도 늘었다.
지난해 8월 국민노동조합 최저임금헌법소원대책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원은 최저임금제도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5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는 헌법 제23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피고용자에게 최저임금을 챙겨주고 정작 고용주인 자신은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리랜서로 분류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있다.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플랫폼 종사자들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지난해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플랫폼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9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많았으나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음식 배달 종사자의 평균 시급은 1만1000원, 대리운전 종사자는 1만 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었으나 택시 운전사와 가사 노동자의 시급은 각 8100원, 87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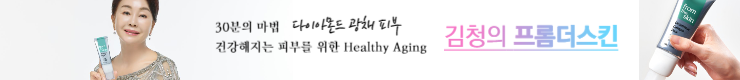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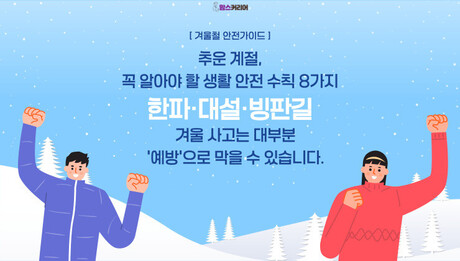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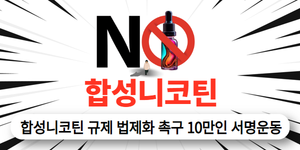
![[아이와 문화생활] 한글은 ‘한글용사 아이야’로 배워요!](/news/data/2025/09/23/p1065616863842460_7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