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 가치관 변해야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100명의 남성과 100명의 여성이 만나 70명의 아기를 낳는다. 다음 세대에는 35명의 남성과 35명의 여성이 만나 25명의 아기를 낳고 그다음 세대에는 12명의 남성과 12명의 여성이 만나 8명의 아기를 낳는다. 200명이었던 인구가 몇 세대를 거치자 8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0.7명일 때 펼쳐지는 대략적인 인구 시나리오다.
2022년 0.778명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6명대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를 통해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율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구문제가 우리나라에 가져올 위기에 대해 지적했다.
전례 없이 낮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여기저기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를 손놓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수많은 정책들을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8년째 내리막길만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훌륭한 교육·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6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을 보고받은 후 "데이터와 수치에 근거해 저출산 원인과 정책 효과를 설명할 전문가를 찾아보라"며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위원 교체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더 이상 나올 정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 저출생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일까.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위가 문제일까.
지난달 18일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저출생 정책을 내놨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 등 기존에 시행되는 정부의 지원금에 시에서 2800만 원을 더해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에서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여성들은 환호했다. 지역 맘카페에는 '아이를 낳는다면 인천에서 출산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금성 지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 1억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부담으로 느껴진다. 외롭지만 혼자 먹고살기도 바빠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육아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해서 얻은 경력을 잃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자식농사를 제일로 여기고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부모 세대와는 다르다.
수원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김씨(33세)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다. 김씨는 "저출생으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거라는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지만 당장 내 삶에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2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자영업자이다 보니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고 아이를 낳아도 내내 남의 손에 맡겨야 한다면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좋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책 때문에 아이를 낳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러운 청년들, 육아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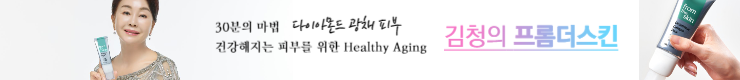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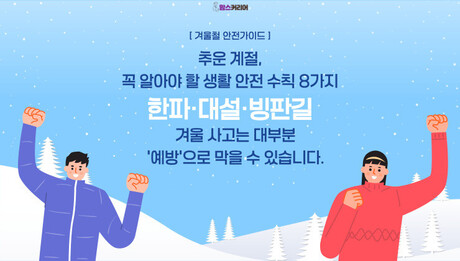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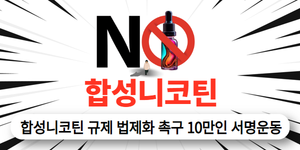
![[아이와 문화생활] 한글은 ‘한글용사 아이야’로 배워요!](/news/data/2025/09/23/p1065616863842460_728_h2.jpg)




